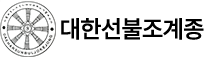통합 검색
통합 검색
종헌선언문 (宗憲 宣言文)
불교(佛敎)가 우리나라에 전(傳)해온 이래(以來)로 교종(敎宗)과 선종(禪宗)이 다함께 육성발전(育成發展) 하였다.
교종(敎宗)의 오파(五派)와 선종(禪宗)의 상호(相互) 정립(鼎立)하여 처음에는 독특(獨特)하게 개산(開山)하여 불법(佛法)
의 수행(修行)과 교화(敎化)에 당(堂)을 열고 선양(宣揚)에 사명(使命)을 다하다가 12세기(世紀) 고려때는
안팎으로 계속되는 정변(政變)의 소용돌이 속에 불교(佛敎)가 함께 휩쓸리어 불교적 계행(戒行)의 기강이 해이해져
안으로는 선(禪)과 교(敎)의 대립(對立)이 극심(極甚)하여 상구보제 불화중생(不化衆生)하는 종교(宗敎) 본연(本然)의
위치를 잃어갈 수 밖에 없었다.
불교(佛敎)는 현실정치(現實政治)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는 가운에 승려(僧侶)의 종교적 현실(宗敎的 現實)을
바로잡고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종지(宗旨)의
필연적(必然的)인 마찰(摩擦)을 해소 선(禪)·교(敎)를 회통(會通)시켜 시대적 과업을 해결한 도의국사, 이후
수심법(修心法)의 대법(大法)을 크게 제창(提唱)하여 돈오점수(頓悟漸修) · 선교회통(禪敎會通) ·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실천에 옮겨 우리나라 불교(佛敎)의 독특(獨特)한 종문(宗門)이 개산(開山)된 것이다.
기후(其後) 이조시대(李朝時代)는 억불숭유 정책(抑佛崇儒 政策)으로 불교(佛敎) 종풍(宗風)의 법향(法香)이
활발(活撥)하지 못하였고 또한 상중불교(山中佛敎)로 은둔하여 불조(佛祖)의 가르침이 중생(衆生)을 떠나
말이나 문자(文字)를 떠난 곳에서 찬연하게 영광(靈光)을 발(發)하지 못했으나 본중(本宗)은 일체(一切)의
치우치지 않는 묘합회통 정신(妙合會通 精神)으로 새로운 불교계(佛敎界)의 발전(發展)을 위하여 제종(諸宗)을
원융하고 선(禪)·교(敎)의 단일법맥(單一法脈)을 수립(樹立) 또한 도의국사, 이후 정혜쌍수(定慧雙修)와
돈오점수(頓悟漸修) · 간화선(看話禪)의 모합회통(妙合會通)의 융회사상(融會思想)과 이념(理念)을
구현(具現) 화응기 설법(化應機 說法)의 종승(宗乘)을 선양(宣揚)하고자 인교오심(人敎悟心)의 일념(一念)으로
한국불교(韓國佛敎)를 유신(維新)하고 시대(時代)에 적응(適應)할 수 있는 정통(正統) 교단(敎團)을
재건(再建) 중창(重創)한다.
우리 대한선불(大韓禪佛) 조계종(曹溪宗)은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타원만(覺他圓滿), 원돈성불(圓頓成佛)
한 부처님의 교리(敎理)를 봉체(奉體)하고 종조(宗祖)의 본지(本旨)를 다시 밝혀 불조(佛祖)의 해명(慧命)을
이어 나가려는 시대적(時代的) 사명감(使命感)과 대원력(大願力)으로 수심(修心)하여 종명(宗名)을
공칭(公稱)하고 종헌(宗憲) · 종법(宗法)을 제정(制定)하여 수심(修芯)의 길을 개척(開拓)하여 깨침과 닦음을
통하여 인간(人間)의 본래적(本來的)인 자기의 모습에 개오(開悟)하여 모든 중생(衆生)들에게 도생(度生)의
문(門)을 열어 교화(敎化)의 사명(使命)을 다하자 한다.
중도대중(衆徒大衆)은 이 헌전(憲典)의 대유(大猶)를 준수(遵守)하여 종단(宗團)의 기반(基盤)을 영속(永續)하게
하고 자기 상실(喪失)의 깊은 늪에서 허덕이는 현대인(現代人)에게 구원(救援)의 진실(眞實)한 생명(生命)의
원음(圓音)을 상방(常放)하여 세도(世道)의 광명(光明)을 밝히고자 대한선불(大韓禪佛) 조계종(曹溪宗)을
중창(重創)을 선포(宣布)한다.
불기(佛紀) 2552年 5月 20日
본 종은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봉체하고 불교계의 제종을 원융하고,
선교의 단일법맥을 수립한 도의국사를 종조로 한다.
도의국사가 살았던 신라 하대(37대 선덕왕~56대 경순왕 780~935)는
방계 김씨 왕실이 등장해 치 열한 왕위 쟁탈전을 벌이는 등 어지러움에 빠져든 시기였다.
46대 문성왕에 이르러 사회가 일시 안정되지만, 그것도 잠시 50대 진성여왕의
실정(失政)으로 통 일신라는 이내 난세로 돌아가 버렸다.
신라 통일의 사상적 원천이 됐던 화엄 등 교학불교 또한 이때에 이르러
‘현학적이고 사제(司祭) 적인 불교’로 흐르고, 사원은 왕실귀족의 선왕영조(先王列祖)를
봉덕하는 장소로 변하고 말았다.
이러한 시기에 남종선 이 전래된 것이다.
물론 진덕왕(647~653) 무렵 법랑(法郞) 선사가 중국 선종 4조 쌍봉도신의
동산종을 전래한 일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선의 도입은 41대 헌덕왕 이후부터라 할수 있다.
헌덕왕 13년(831) 도의(道義) 선사가 서당지장육조혜능->남악회양->마조도일법맥)의 선법을
도입 한것.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교학만 숭상하고 선법을 믿지 않아 도의국사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9세기 전반 ‘수용의 진통’을 겪은 선은 9세기 중반을 고비로 신라지방 곳곳에
‘산문의 기반’을 닦는다.
도의 국사는 그러면 어떤 선사상을 갖고 왔을까.
학자들은 서당 문하에서 ‘즉심즉불(卽心卽佛).비심비불(非心非佛) 사상’을 배웠고,
백장산 회해선사로부터는 ‘청규에 대한 이해’를 돈독히 했을것으로 파악한다.
백장회해는 선종사원의 규범인 <백장청규>를 지은 인물.
<백장청규>는 종래 계율 중심의 수행에서 청규에 의한 지의(持儀) 형태의 수행
규범을 강조한 것 으로, 특히 선종을 독립된 종파나 교단으로 성립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책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도의 국사는 홍주종의 선풍을 국내에 전하며 아울러 선종산문이
독자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청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해 진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아 설산에 은거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의국사는
우리나라선종의 제1조로 추앙받았고, 진전사 도의국사 영탑(靈塔)은 조사당으로서의
의미를 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당(西堂)의 법을 이었고 명주에 살았다. 선사의 휘는 도의(道義)요, 속성은 왕(王)씨며,
북한군 사람이다.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하신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도의국사께서 창수하신 수심대법의 돈오점수, 선교회통, 정혜쌍수를 종지로 삼고 묘합회통의 윤회사상과 하응기설법의 종승을 선양하고 인교오심 정신을 종풍으로 하여 한국불교를 유신하고자 한다.